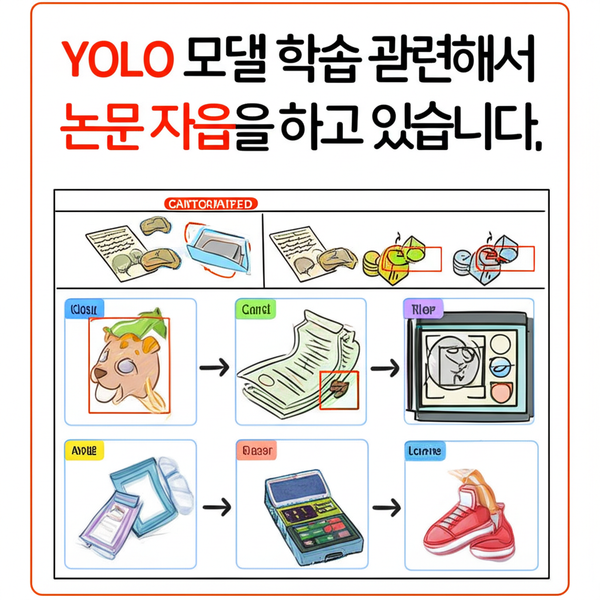AI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에 도달하려면 몸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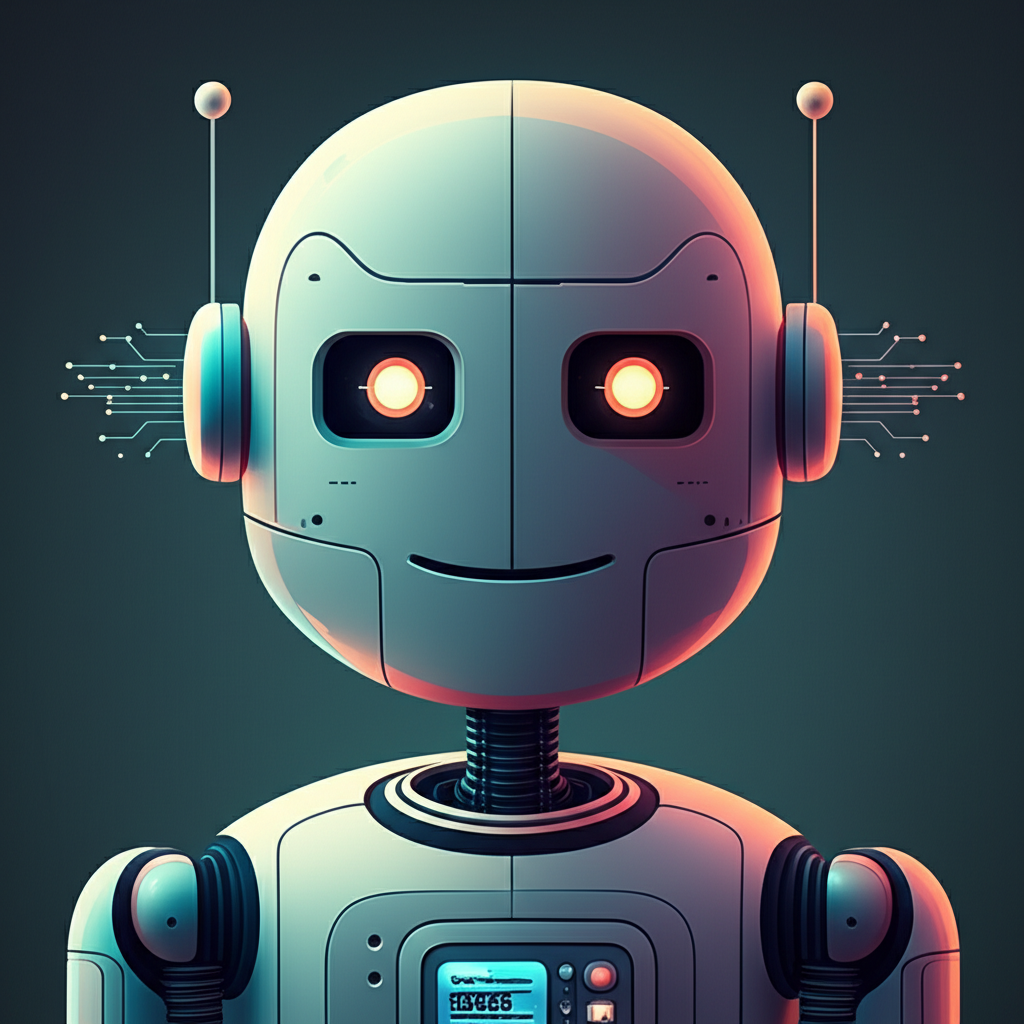
어릴 적 가장 먼저 기억나는 로봇은 애니메이션 '제트슨 가족'에 등장하는 로지였다. 그 후 곧바로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세련된 C-3PO와 그의 충실한 동료 R2-D2가 떠오른다. 하지만 내가 처음 만난 비육체적 인공지능은 바로 영화 '워게임'의 조슈아였다. 조슈아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다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개념을 배우고 결국 핵전쟁 대신 체스를 선택하는 컴퓨터였다.
이 사례들을 보면, AI가 몸을 갖고 있든 없든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소통하거나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심지어는 더 뛰어난 사고 능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체스나 바둑처럼 명확한 규칙이 있는 게임에서 AI는 이미 인간을 능가했다. 그러나 AI는 인간 특유의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맥락에 따른 복잡한 판단, 감정 등 전체적인 인간 지성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간은 같은 상황에서도 늘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비논리적이거나 다양한 상황적 해석을 더한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런 복합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가까워지려면 단순히 정보 처리나 사고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환경 경험, 감각적 입력, 신체와의 상호작용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운다. 따라서 AI가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려면 로봇처럼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도 꾸준하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AI가 신체 없이도 충분히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AI는 대규모의 정보 공유, 빠른 학습,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인간을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인공지능은 창의적 작업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결과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AI가 인간과 같은 지능에 도달하는 데 신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간과 진정으로 유사한 의식, 경험, 공감 능력까지 갖추려면 신체적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 AI가 고도화될수록 단순히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상호보완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AI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